등록 : 2019.09.01 17:54
수정 : 2019.09.01 19:10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건 도널드 트럼프나 자이르 보우소나루 같은 몇몇 권력자 말고는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개인의 실천이나 정책의 실행 앞에는 심각한 딜레마가 놓여 있다. 첫째, 나는 덜 배출해도 남이 더 배출하면 지구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그 결과는 에어컨 없이 버티는 내게 전가된다. 둘째, 수요관리를 위해 요금이나 세금을 올리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 큰 고통을 받는다.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가 유류세 인상에 반발하는 저소득층에 의해 촉발된 사정도 거기에 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최신 보고서(조혜경 연구위원)는 이런 “환경과 민생의 대결구도”를 재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스위스의 ‘탄소세 생태배당 모델’을 소개했다. 스위스는 2008년부터 난방용 화석연료에 탄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담금은 정부의 연도별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때 부과하는데, 목표치도 단위 부담금도 해마다 오른다. 2008년 이산화탄소 1t당 12프랑(1만4700원)이던 것이 2018년 1월에는 96프랑(11만7400원)까지 올랐다.
이렇게 거둬들인 돈은 ‘생태배당’으로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 사람은 그만큼 많은 부담금을 내고 적게 배출한 사람은 적게 내지만, 배당금은 모든 국민에게 엔(N)분의 1로 균등배분된다. ‘기본소득’의 생태 버전인 셈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소득 재분배 성격을 띤다. 저소득층의 저항감을 낮추면서 탄소 배출 감축도 유도한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난방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파르게 줄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자동차 연료에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미국과 독일에서도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얼마 전 16살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9월21일 전세계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동참을 호소하며 요트로 대서양을 건넜다. 이날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학원 대신 거리에 모여 집단지성을 발휘해보기를 기대한다. 생태배당처럼 기후위기를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대안의 현실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안영춘 논설위원
jona@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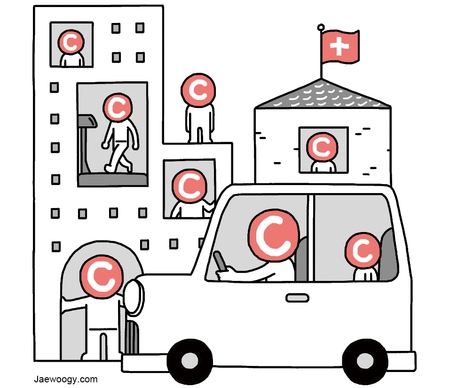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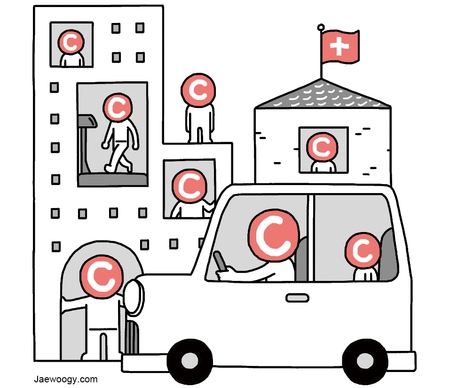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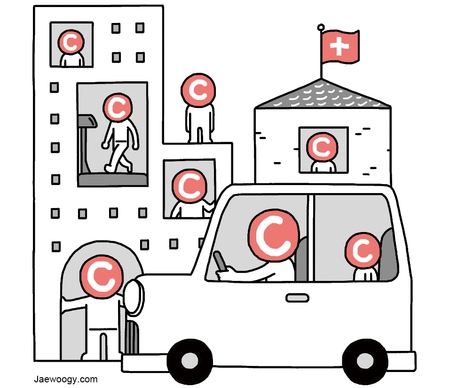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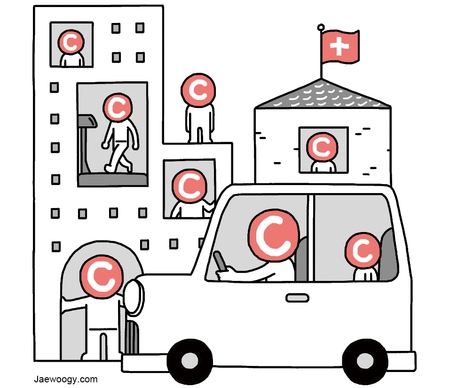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