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구병 농부철학자
|
1896년 사월칠일에 나온 <독립신문> 창간호에서 따온 글이다. 주시경 선생은 100년도 훨씬 앞서 이렇게 쉬운 글로 우리 할머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깨우쳤다. 지금 ‘지식인’들이 그 몫을 이어받고 있는가?
내친김이니 다시 상소리를 이어가자. 이번에는 ‘남근’, ‘여근’이라는 ‘교양’이 철철 넘쳐흐르는 ‘학술용어’ 버리고 ‘자지’, ‘보지’다. 고→곳→좃→젓이 하나같이 솟아오른 것, 뻗쳐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말은 이미 했다. ‘자지’는 조(좃)의 ‘아지’(아기)다. ‘아지’는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를 떠올리면 곧 알 수 있다. ‘조아지’의 준말이 ‘자지’다. 불두덩에서 솟았으되 아직 어려서 작게 솟아오른 것이 ‘자지’다. 옛날에는 아이들 것만 ‘자지’라고 불렀다. ‘보지’는 어떤가? ‘보아지’의 준말이다. ‘보’는 감싸는 것이다. 아기를 감싸고 있는 데를 ‘자궁’이라는 점잖은 말로 눈가림하지 않고 우리말로는 ‘애기보’라고 불렀다. 작은 보자기여서 ‘보지’다. 이것도 아직 덜 자란 ‘아기보’다.
그러면 ‘좃’의 짝이 되는 우리말은 무엇인가? ‘씹’이다. 이 말에는 다른 뜻이 없다. ‘씨’를 받아들이는 ‘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씨+입’→‘씹’이다. 이 사연을 이미 앞 적에 글로 써서 넘겼다. ‘언니를 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보다 더 서러운 사람은 자지를 자지라고, 보지를 보지라고 입에 담지 못하는 아이들이다’는 말과 함께.
아이들은 서너 살 무렵부터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이 말들을 입에 올린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이 말을 아이들이 입 밖에 내지 못하게 말문을 막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말을 말 같지 않게 여기고, 힘센 나라에서 들여온 알아듣기 힘들고 소리내기 힘든 말만 우러르는 ‘먹물’들이 예로부터 이 나라를 쥐고 흔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땅 이름을 살펴보자. 내가 알기로 서울에서 널리 알려진 곳 가운데 우리말 땅 이름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데는 ‘모래내’밖에 없다. ‘흑석동’, ‘현석동’, ‘풍납동’… 서울의 ‘지명’이다. 머리에 무엇이 떠오르는가? 아무것도 없다. 옛날에 ‘흑석동’은 ‘감은돌이’었다. 한강이 흐르다가 강 ☆쪽으로 불거져나간 벼랑을 끼고 감아도는 곳이 ‘감은돌이’다.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 없는 먹물들이 책상머리에 붙어앉아 “‘감은 돌’? ‘검은 돌’, 그러면 ‘진서’로는 검을 흑(黑), 돌 석(石), ‘흑석’으로 써야지” 하고 바꿔치기했다. 그런데 어럽쇼. ‘삼개’(마포) 지나서 또 ‘감은돌이’가 있네. 쩝쩝. 이건 검을 현(玄), 돌 석(石)을 써서 ‘현석’동으로 바꾸지. 자, ‘감은돌이’와 ‘흑석동’, ‘현석동’이 어떻게 다른지 알겠는가? 흑석동, 현석동에서는 안 보이던 것이 ‘감은돌이’에서는 또렷이 떠오르지 않는가? ‘풍납동’도 옛날에는 ‘바람드리’였다. ‘웃바람드리’, ‘아랫바람드리’가 흙으로 쌓은 옛 울바자(토성) 둘레의 이름이었다. 이 ‘먹물’들은 땅 이름만 없앤 게 아니라, 땅 이름을 빼앗으면서 우리의 상상력마저 죽여버렸다. 다시는 이딴 짓 하지 못하게 ‘교수형’시키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제 우리말 ‘받침’(종성·終聲) 차례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한글학자들 애쓴 것 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면서까지 우리말, 우리 얼 지키려고 목숨 걸었던 뜻에 고맙다고 큰절 바친다. 그런데도 아쉬운 게 있다. ‘받침 문제’다.
‘한글 마춤법(맞춤법) 통일안’은 1933년에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직 ‘훈민정음 원본’(해례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훈민정음 원본 첫머리에 붙어 있는 여덟쪽만 알려져 있었는데, 일곱째 쪽에 ‘끝소리는 첫소리를 다시 쓴다’(終聲復用初聲)라는 글이 적혀 있다. 이것이 우리말 받침 문제를 꼬이게 한 빌미가 되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타난 것은 1940년 7월이었다. <훈민정음>이 첫 모습을 드러낸 해는 1443년이었으나 갈고 다듬어 제 모습을 갖춘 해는 1446년이었다. 이 1446년 <해례본>에는 끝소리에 ㄱㆁㄷㄴㅂㅁㅅㄹ 여덟 자만 쓸 수 있게 했다. 그 뒤로 일흔 해 뒤 여름에 뛰어난 우리말 연구가이자 ‘언어학자’인 최세진이 홀소리와 닿소리 차례를 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으로 매기고 닿소리 가운데 ㄱㄴㄷㄹㅁㅂㅅㅇ만 받침으로 써야 한다는 <훈민정음>의 뜻을 이어받았다. (최세진이 받침으로 ‘ㄷ’을 따로 쓰는 데 딴지를 걸었는데, 그 까닭은 그이가 보기로 받침에서 ‘ㄷ’과 ‘ㅅ’은 소릿값이 같기 때문이었다.) 그 뒤로 조선조 말기인 ‘갑오경장’ 때까지, 그러니까 1894년까지 옛 어른들은 5세기(488년) 동안 받침 여덟 자를 끈질기게 지켜왔다. 그러다가 1921년에는 ㅅ과 소릿값이 다르지 않은 ‘ㄷ’ 받침을 가려 적는 것이 우스갯말로 ‘디긋디긋’해서 빼버리기로 하여 ㄱㄴㄹㅁㅂㅅㅇ 일곱 자로까지 줄었다.
그런데 맙소사, 1945년 8월15일 ‘해방’을 맞은 뒤로 갑자기 ‘받침’은 서른 개가 넘게 가지를 쳤다. 온 세상 글의 역사를 샅샅이 뒤져도 쉬운 글자를 어려운 글자로 바꿔친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른바 ‘국어학자’들의 ‘투철’한 ‘먹물근성’이 세종대왕의 뜻마저 꺾을 만큼 굳세졌다고 보면 ‘헛것’을 본 것인가?
이제부터 우리말과 글을 샛길로 들게 한 ‘학문 동네’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학력별무’의 최한룡 선생에 이어 그보다 먼저 태어났고 일찍 돌아가신 정경해 선생의 입을 빌려 쓴소리 몇마디 덧붙이자. (정경해 선생은 1911년에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 1929년에 경기도 공립사범학교를 나온 뒤에 국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1976년에 정년을 맞고 1995년에 돌아가신 분이다.)
“우리 민족에게 국어는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이오. 국어를 잃어버리면 민족이 없어지는 것이고 국어가 병들면 민족정신이 병들게 되는 것이오.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국어의 근본이 잘못 잡혀 있고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의 정신이 쇠퇴해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오. …”
이분이 ‘올바름은 결국 그릇됨을 이겨내는 법’이라고 믿고 <하오 정경해 국어학 논총>에 그사이 쓴 글들을 모아놓은 해는 1995년이다. 깨알 같은 글자로 1000쪽이 넘는 이 책에 ‘머리말’을 쓰신 지 한 달이 채 못 되어 눈을 감으셨다.
‘여자’의 우리말이 ‘가시’이고, ‘남자’의 우리말이 ‘버시’ 또는 ‘바시’였던 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가씨’는 잘 알고, ‘각시’는 들어보았어도 ‘가시’가 ‘곶’으로 바뀌고, 이어서 ‘꽃’이 되었다는 말의 뿌리도, ‘바시’가 ‘바지’로 자취만 남았다는 것도 눈여겨보지 않겠지. 아버지가 왜 ‘아버지’인 줄도 깜깜할 테니까.
1896년 사월칠일에 나온 <독립신문> 창간호에서 따온 글이다. 주시경 선생은 100년도 훨씬 앞서 이렇게 쉬운 글로 우리 할머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깨우쳤다. 지금 ‘지식인’들이 그 몫을 이어받고 있는가?
윤구병 농부철학자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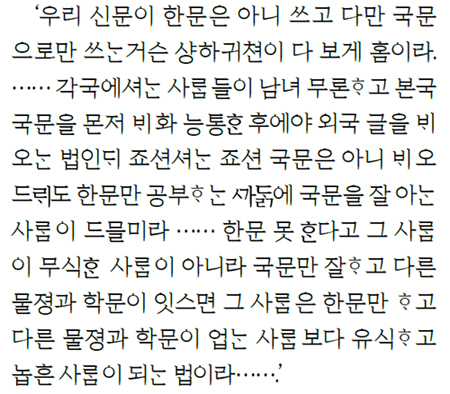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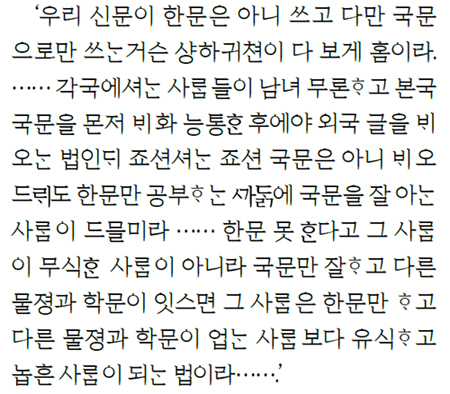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