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공개강연에서 “디플레이션이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본과 20년 차를 두고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인정했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디플레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 경제주체들이 경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소비·투자를 줄이고, 이 때문에 경기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빚어진다. 20년 장기불황의 일본이 그 사례다. 달리 말하면 디플레 우려가 크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특단의 대책을 펴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 현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 지금은 미국 경제를 금융위기에서 구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양적완화 정책 시행 초기인 2009~2010년에는 달러 가치 폭락과 초인플레이션 시대 도래를 걱정하는 일부 정치인이나 학자들과 맞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우리는 어떤가. 정부는 디플레 논쟁을 할 준비조차 돼 있지 않다. 되레 경기 진단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부총리는 디플레가 걱정이라고 말했다가 한시간도 안 돼 “지금이 디플레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가 이끄는 기재부의 간부와 실무자들은 디플레는커녕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최 부총리 발언이 나오기 불과 하루 전 기재부는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부총리가 취임 반년이 넘어도 이슈만 띄우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정치인 때를 벗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디플레 논쟁을 본격 시작하기에는 남모를 고민거리가 따로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기재부 간부와 실무자들도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 자신들도 확고한 판단을 내리기엔 현 상황이 혼란스러운 것인지도 가늠이 어렵다. 물론 지난해 초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디플레 논쟁은 뜨거웠다. 1%대 낮은 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다가 급기야 0%대로 떨어지고 경기도 정체 국면이 길어지면서 디플레 주장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 1월 기준)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5%)을 웃도는 2.29%다. 오이시디 회원국 34개국 중 캐나다·터키·남아공·칠레만 우리보다 더 높다. 기대인플레이션도 2%를 넘는다. 디플레 주장을 반박할 근거도 많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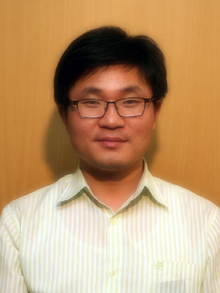 |
|
김경락 기자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