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2.25 20:05
수정 : 2016.02.25 20:05
황진미의 TV 톡톡
<프로듀스 101>(엠넷)은 ‘국가대표 걸그룹’을 만들겠다며, 101명의 소녀들 중 11명을 뽑는 서바이벌 오디션이다. 소녀들은 46개 연예기획사에서 온 연습생들로, 모두 ‘데뷔’가 목표이다. 프로그램은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이루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차별점은 심사위원 없이 오직 시청자들의 투표로 선발한다는 점과, 철저하게 ‘걸그룹 만들기’에 충실한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시청자들을 ‘국민 프로듀서’로 부르며, 투표로 선발하는 방식은 인기 영합적이다. 시청자들은 방송에 나온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력보다 호감이나 취향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결국 인기투표다. 물론 제작진에게도 명분은 있다. 어차피 ‘걸그룹’의 성패는 객관적인 실력보다 대중의 인기에 좌우될 테니, 문제가 안 된다는 것. 즉 대중의 권력을 강하게 인정하는 논리다. 그런데 제한된 방송시간 동안 101명의 참가자들을 고루 비추는 건 불가능하다. 제작진의 편집을 통해 걸러진 참가자들에게 투표가 이루어진다.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혹은 거짓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다. ‘국가대표 걸그룹’이니, ‘국민 프로듀서’니 하는 말로, 시청자들에게 결정권이 있는 듯 설레발을 치지만, 이미 제작진의 의도에 의해 판이 짜인 구도에서, 시청자들은 관심과 호응을 제공해줄 존재로 동원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원료로 삼는 것은 참가자들의 절박한 꿈과 시청자들의 ‘팬심’이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교묘한 차림표를 짠다. 가령 연기자 지망생이었던 김소혜는 노래와 춤으로 낙제점을 받지만, 시청자 투표로 최종 11명 안에 들어간다. 이는 물론 우호적인 편집의 결과이다. 피라미드 형태의 무대와 등짝에 A부터 F까지 등급이 써진 옷이 말해주듯, 프로그램은 실력과 노력과 경쟁을 강조한다. 여기서 김소혜는 ‘예외’를 담당한다. 101명의 소녀들 중 11명을 뽑는다는 숫자에 암시된 그 ‘예외’ 말이다. 감정이입을 통해 꼴찌를 응원하고, 역전의 드라마에 환호하는 ‘팬심’을 동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작진의 미끼상품으로, 초경쟁사회에서 ‘선한 노력과 운(혹은 보이지 않는 대타자의 선택)에 의한 성공’이라는 판타지를 상품화한 것이다.
<프로듀스 101>은 참가자의 개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김주나는 매력적인 보컬로 솔로 데뷔가 어울리지만, 걸그룹이 되기 위해 혹독한 춤 연습에 돌입한다. 참가자들은 밤샘연습을 통해, 점차 기존 걸그룹의 퍼포먼스를 재현한다. 여기서 예술성은 중요하지 않다. 똑같은 노래와 춤을 맞춰낼 수 있는 기능과 혹독한 반복훈련을 견뎌낼 정신력이 중요하다. 예술이라기보다 스포츠에 가까운데, 이것이 ‘케이팝 걸그룹’의 본질이기도 하다. 오랜 연습생 생활, 합숙훈련, 노예계약 등을 통해서, 귀여움과 섹시함을 장착한 채 라이브로 노래하면서도 ‘하이힐의 칼군무’가 가능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예쁨과 공손함을 잃지 않는 ‘케이팝 걸그룹’이 만들어지는 획일화된 생산공정을 프로그램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즉 ‘케이팝’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열정과 꿈을 갈아 넣어 돌아가는 거대한 맷돌 산업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견학시킨다.
<프로듀스 101>의 순기능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일 것이다. 이제 공부가 싫다고 연예인이 되겠다는 청소년은 없을 것이다. 연예산업은 억압이나 경쟁이 싫어서 탈주하고픈 자유와 낭만의 영역이 아니라, 경쟁과 규율이 가장 혹독한 분야라는 것을 90도로 인사하는 101명의 소녀들이 각인시켜 주었다. ‘케이팝’의 환상 대신 ‘헬조선’의 진실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은 말한다. “얘들아, 학교 안이 전쟁터라면, 학교 밖은 지옥이란다.” 아이들에게 인생의 목표는 경쟁이 아니라 성숙에 있음을 말해줄 수 있을까. 꽃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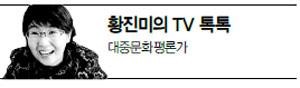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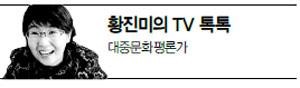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