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11.26 18:02
수정 : 2015.11.03 00:44
정혜윤의 새벽 3시의 책읽기 /
교보문고에서 2010 베스트 열 권을 뽑아 달란 말을 들었더니 아 올해가 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10년이란 시간을 일반적인 시간, 그러니까 12월이 되면 누구에게나 한 해는 가고 만다는 그 사실에 복속시키고 싶지 않은 욕구가 내부에서 가슴 아프게 올라온다. 올해 읽었던 좋은 책들은 내 맘속의 하이쿠로 만들고 싶을 만큼 절박하다. 아니 이제부터라도 한해 한해 읽었던 좋은 책들은 다 내 삶 속의 하이쿠로 만들어 수시로 나를 찌르게 하고 싶다.
이 칼럼의 제목처럼 새벽 세시에 잠 못 들고 나를 눕지도 앉지도 못하게 만든 책으로는 가즈오 이시구로 <나를 보내지 마>와 볼라뇨의 <칠레의 밤>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자크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과 엘리 러셀 혹실드의 <감정노동> 역시 읽고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 칼럼에도 쓴 적이 있는 <생존자>, 그리고 요새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고전 읽기와 관련해서는 토머스 하디의 <이름없는 주드>, 미시마 유키오의 <가면의 고백>,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코틀로반>, 장 주네의 <도둑일기>,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소멸>, 토마스 만의 <마의 산>에 크게 영향받았다. 그리고 놓치기 너무 아까운 신작으로는 살만 루시디의 <광대 살리마르>, 데니스 루헤인의 <운명의 날>, 오쿠다 히데오의 <올림픽의 몸값>, 아서 쾨슬러의 <한낮의 어둠>을 올해가 가기 전에 읽을 책으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볼라뇨의 <칠레의 밤>에 대해선 죽기 전날 밤의 변명이란 부제를 내 맘대로 달아뒀다. 죽기 전날 변명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나는 이 책을 읽고 배웠다.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에서 네덜란드어를 모르는 프랑스인 조제프 자코프는 어떤 지적 모험을 하게 된다. 즉 네덜란드에 가서 프랑스어를 가르쳐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정확히 말하면 스승은 네덜란드어를 모르고 제자들은 프랑스어를 모르는 상황), 그런데 이들이 겪은 일이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고정 관념을 뒤흔들어 놓는다. 학생들은 프랑스어 철자법도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프랑스어를 스스로 익히기 시작했다. 교육에 있어서 유식한 자 무식한 자 유능한 자 무능한 자 똑똑한 자 바보 같은 자의 분할이 깨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만약 천재 교육을 원하는 부모라면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이 책에서 “나는 인간이다. 고로 생각한다”로 뒤집을 때 인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신뢰가 사람을 얼마나 해방시키는지 알게 될 것 같다.
 |
|
정혜윤 <시비에스> 피디
|
<감정노동>은 언제나 친절한 항공사 승무원의 미소로 시작한다. 감정노동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자신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고양시키거나 억제할 때의 노동을 말한다. 승무원들뿐 아니라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미소가 저마다의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요구된 것의 결과물일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감정노동은 무엇인가란 질문은 우리 사회에서 한 인간의 감정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에까지 이르게 된다. 서비스직의 비중이 늘어가는 사회에서 감정이 상품이 된다면 그렇다면 내 진짜 감정은 언제 어디서 표현해야 하나부터 나는 도대체 정말은 뭘 느끼는가까지 다 궁금해질 것이다. 이번 글에 다 소개 못한 책은 다음 연재 때 이어서 소개하겠다. 책으로 이어지는 밤은 확실히 천일야화의 밤이고,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정혜윤 <시비에스> 피디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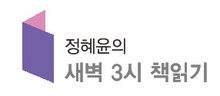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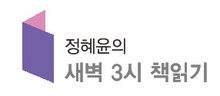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