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9.23 18:54
수정 : 2015.11.03 00:45
 |
|
정혜윤
|
정혜윤의 새벽 세시 책읽기
지난 화요일 해질 무렵 서울 하늘을 올려다본 사람들은 숨 막히게 아름다운 노을 때문에 넋을 잃었을 것이다. 분홍빛으로 물든 구름이 해질녘에 풀밭을 가로질러 가는 양 떼 같았고 푸른 하늘에 흩어지는 깃털 같았다. 장관이라고밖에 표현 못할 구름들을 한참 보다가 그 구름들을 따라 길을 나섰다. 보는 사람 없어도 묵묵히 아름다울 수도 있었을 구름이 자동차 속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너 잘 지내고 있니?” 묻는 것만 같았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대답하면서 뛰어가고 싶었고 그때 조금은 울고 싶었다.
나는 이런 석양에 대한 묘사를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에서 읽은 일이 있다. 코로의 유언은 “오늘 밤 꿈에서 하늘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든 풍경을 보았네. 멋있더군”이었다. 고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 좋아. 우리는 모네, 피사로, 르누아르에게서 이런 분홍빛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날 나는 인상파 화가도 그리고 싶어 했던 영원한 하늘을 보았던 셈이다.
빈센트 반 고흐에겐 평생 해결할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먹고사는 문제, 두 번째는 색채의 문제였다. 고흐는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머릿속 생각을 어두운 바탕 위에 밝은 색조로 표현하고, 몇 개의 별로 동경을 표현하며 석양의 광채로 어떤 정념을 표현’하는 색을 칠하고 싶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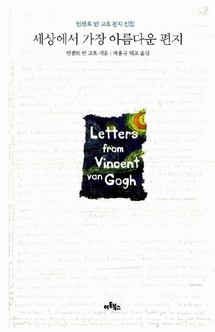 |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 빈센트 반 고흐 지음·박홍규 엮고 옮김/아트북스·2만6000원
|
그는 사람이 자기 한 몸을 잘 건사할 수 있으려면 하루 빵 한쪽과 술 한잔도 필요하지만 무한한 별과 저 높은 창공을 느껴야만 한다고 믿었다. 그는 이 지구에서 태양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불순하다고 생각했다. 또 그는 지구가 둥글듯 인생도 둥근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우린 앞날이 쭉 평탄한 직선으로 이어지길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도 지구처럼 둥글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 빈센트 반 고흐는 사람의 얼굴을 별이 총총한 파란 하늘을 바탕으로 그리고 싶어 했다. 인물의 배경색을 칠할 때 어둡고 누추한 벽 색깔 대신에 무한의 느낌을 주는 가장 강렬한 파랑색으로 칠하고 싶어 하기도 했다. 그는 왜 인물화에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그려 넣고 싶어 했을까? 나는 고흐의 편지 속 이 구절이 그 대답이 아닐까 짐작만 해본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인간이라도) 그런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본능으로 느끼고 있어. 즉 나도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인간이라는 것, 나에게도 생존 이유가 있다고 느낀다는 거야. 자신이 정말 다른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는 유용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무엇에 도움이 될까? 나의 내면에는 무엇인가 있어.”
나는 고통으로 주름진 얼굴 뒤로 별이 총총 빛나는 밤하늘을 그려 넣고 싶어 한 고흐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 그때 아마 고흐가 그린 인물들은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른다. ‘아! 나의 영혼, 네가 그것을 알아챘구나.’ 그리고 어느 때인가는 내 앞에 서 있는 슬픈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 머리 위로 별이 빛나는 밤을 맘속으로 그려 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생각한다. 지난 화요일 석양을 바라보며 넋을 잃은 사람들은 모두 고흐였으리라. 그들은 그날 머나먼 밤하늘이 아니라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연인의 머리 위에서 총총히 빛나는 별무리를 발견했으리라.
<시비에스>(CBS) 피디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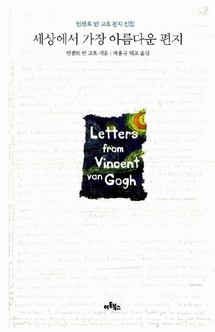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