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2.07 20:13
수정 : 2017.12.07 20:21
[서영인의 책탐책틈]
아내들의 학교 박민정 지음/문학동네(2017)
영초언니 서명숙 지음/문학동네(2017)
세 여자 1, 2 조선희 지음/한겨레출판(2017)
당대의 여성 현실을 뜨겁고 예리하게 가로지르는 화제작들을 다 읽고 나서도, 마지막에 실린 ‘천사는 마리아를 떠나갔다’가 제일 마음에 오래 남았다. <아내들의 학교>에 수록된 이 작품은 1980년대 대학시절을 보낸, 재건축을 앞둔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엄마 세대의 이야기이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고문에 정신을 놓은 필남 언니와, 버스 안내양을 하다가 모멸감을 견딜 수 없어 몸에 불을 지른 주혜의 불행한 삶을 죄책감으로 안고 사는, 세상이 이런데 기도만 하는 엄마를 힐난하는 딸을 가진 그런 엄마의 이야기. 나이는 들었어도 엄마 세대는 아니구만, 딸도 없는데 나는 왜 또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쏠리나 싶었다.
‘작가의 말’에서는 “어머니의 자전소설을 대신 쓴다고 생각하고 쓴 이야기”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구나, 소설은 엄마의 음성으로 전달되지만 그것을 쓴 사람은 결국 작가라는 것을 잠시 잊었다. 그러니까 소설은 딸을 걱정하고 자신의 지난 시간을 기억하는 엄마의 말로 쓰여 있지만, 사실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의 삶을 상상하는 딸의 시선이 이 이야기들을 만든 것이었다. “왜 다들 재개발한다고 환장해갖고 애들 안전은 신경도 안 썼을까?” 딸의 힐난이 억울하고 불편했겠지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엄마는 할 말이 없다. 딸도 알고 있을 것이다. 엄마는 엄마대로 엄마의 시간을 견뎌왔다는 것을. 그러니 이 이야기는 딸이 쓰는 엄마의 기억이며, 엄마가 지켜보는 딸의 들끓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나는 딸의 이야기이면서 엄마의 이야기인 이 사이를 오가면서 둘 다에 마음을 주느라 이 소설에 꽂힌 거였구나 싶었다. 딸이거나 엄마이거나 어느 하나에 나를 기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읽고 쓰는 딸과 엄마의 사이에 나도 끼어들어 있었던 것. 그래서 둘째딸인 고등학생 지영은 왜 이름만 나오고 소설에 등장하지 않나, 이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하는 것까지 마음이 쓰였던 거였다.
생각해 보니 이즈음에 읽은 이야기들이 다 그랬다. <영초언니>는 영초언니를 제목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 영초언니와 함께 보낸 작가 서명숙의 이야기이다. 어쩌면 영초언니와 작가 서명숙의 삶은 서로 분간할 수 없게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를 이야기로 불러내려면 다른 이야기가 함께 딸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세 여자>에서 주세죽, 허정숙, 고명자는 씨실과 날실로 엮여서 한명이 아니라 그녀들의 이야기를 함께 구성해 낸다. 그들이 지향했던 사회주의자의 삶이 여자로서 갈망한 자유의 권리를 끌어안은 투쟁이었다는 것. 남자들은 모르는 비밀을 함께 가졌으므로, 그들은 한 시대를 함께 살아낸 공통의 주인공이었다.
이쯤 되면 이런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대세라 할 만하다. 그러니 여자들의 자서전은 쓰는 것이 아니라 쓰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타인의 삶을 상상하고 목소리를 빌려주며, 내 것이 아닐지라도 남의 것만도 아니기에 언제든 어쩔 수 없이 연루되고 기꺼이 차용되면서, 언니거나 딸이거나 엄마이거나 후배나 선배의 이름을 빌려, 여자들의 자서전은 그렇게 쓰인다.
문학평론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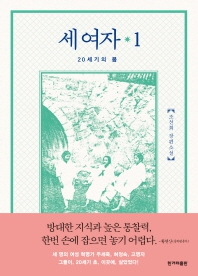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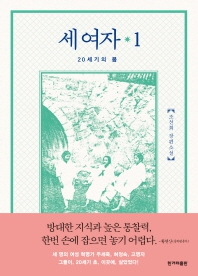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