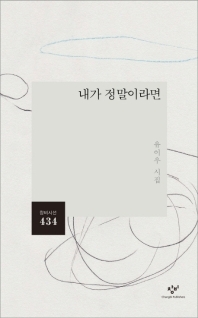 |
[%%IMAGE1%%] [책과 생각] 양경언의 시동걸기
유이우, ‘마을’시집 <내가 정말이라면>(창비·2019) 강상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김군>(2019)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꺼낼까 한다.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의 현장을 포착한 사진 속의 한 남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과정을 담는다. 광주를 직접 겪은 세대라고는 할 수 없는 젊은 제작진은 사진 속 남자가 과거 가게에 자주 놀러왔던 ‘김군’ 같다고 기억을 더듬는 이에서부터 남자와 함께 사진 속에 나와 있던 이들까지 찾아다니며 ‘김군’이 누구인지에 관한 퍼즐을 맞춘다. 그러나 퍼즐을 꿰맞출수록 관객은 5·18 광주항쟁에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지금 삶은 어떠한지, 오늘날 그들은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당시 사진과 고통스럽게 대면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긴장된 목소리로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역사의 현재성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한 시민이 자신의 옆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이를 떠올리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말할 때는 당시를 몸으로 겪었고 현재에도 겪고 있는 이들의 감정이 광주를 겪지 않은 세대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이 영화는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남기는 작품인 한편,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는 세대가 이전 세대와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전 세대가 역사적인 사건에 품고 있는 ‘죄책감’을 젊은 세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한 셈이다. 이는 역사 문제를 대할 때 좀처럼 죄책감을 가져본 적 없는 세대가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화에서 사진 속 남자를 ‘김군’으로 알아봤던 ‘주옥’씨가 1980년 5월 광주에서뿐만 아니라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도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는 모습이 다뤄졌던 이유는 아마 역사를 의미화하는 과정이란 직접적인 체험 유무와 상관없이 과거와 연결된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몫이라는 점을 일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지. 세대를 막론하고 지금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충실한 접근은 역사적 시공간을 오늘날에 접속하게 만든다. 유이우의 첫 시집은 주로 ‘나’와 ‘나’의 주위를 찬찬히 살필 때 일어나는 생경함을 전하는 시들로 채워져 있지만, 그중 어떤 시는 그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듯 고요하게 놓인 풍경을 시인의 눈길이 살짝 터치함으로써 거기에 숨겨져 있던 시간성이 새어 나오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오후가 웅크리고 퍼지지 않았다// 아무 말도 소리를 데리고/ 떠나지 않잖아// 사람들마다 그냥 가는 뒷목이잖아// 걸음을 비웃는 횡단보도 때문에/ 골목은 자꾸 걸음을 돌아보는 습관이야// 이미 엎질러진 커튼처럼/ 저녁이 버스보다 더 달려나가고// 오후가 떠나면/ 조금 더 다가오는 별들// 송전탑에 귀 기울이면/ 이상한 노래로 남을 것 같아// 열어둔/ 창문이 깊다”(유이우, ‘마을’ 전문) 시인은 “오후가 웅크리고” 있는 “마을”의 풍경에 귀 기울이면서 “송전탑”에 남겨진 역사를 듣는다. 나는 순간적으로 밀양의 송전탑을 떠올린다. ‘탈원전’을 외쳤던 할매들을 떠올린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즈음, 한 마을에 남겨진 횡단보도, 골목,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열어둔 창문에 대해서도. 문학평론가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