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02 21:05
수정 : 2019.01.02 23:04
복지부, 임세원 교수 사건 계기로
정신과 진료 현장 안전실태 조사
중증 퇴원환자 외래진료 강화 등
환자 지속적 치료 방안도 추진
 |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추모하는 그림.
|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죽음을 계기로,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중증 정신질환자의 ‘완전한 치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보건의료 시스템이 의사에게 안전한 치료 환경을 보장하지도, 환자에게는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는 정신과 진료 현장의 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진료실에서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진료실에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한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환경을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진료 환경 안전지침안을 마련한 뒤에 재정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진료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강북삼성병원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입구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일부에게 최대 1년까지 외래진료를 받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하는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자나 지자체장이 강제입원시킨 환자가 퇴원할 때,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정신의료기관장이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명령을 거부하면 위험 평가를 위해 강제입원당할 수도 있다. 이 제도에서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빼고, 대상자를 더 넓히겠다는 것이다.
정신의료기관장이 ‘환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관련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이 개선 조치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퇴원 사실이 센터에 통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환자가 센터에 가지 않는 게 문제인데, 병원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신재활시설로 연계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래치료명령제도’ 역시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없다.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뺀다고 해서 제도가 활성화될지 불확실한데다 인권 침해 논란도 있다. 박환갑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총장은 “강제입원됐던 환자들에게 퇴원 뒤에 1년간 무조건 외래치료를 받으라는 것은 또 다른 강제와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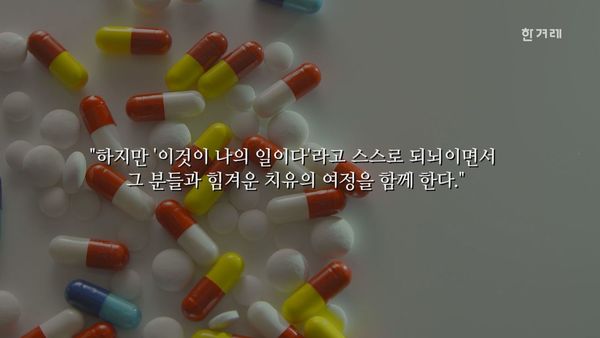 |
|
고 임세원 교수가 생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
|
복지부와 정신과 전문의들은 ‘완전한 진료’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해와 편견이 심해질수록, 환자들이 스스로 치료받기를 꺼리게 되는 탓이다. 이명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이사는 “치료를 받다가 안 받으면 위험성이 커지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확실하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은 “정신질환의 만성적인 특성상 치료서비스가 촘촘하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신과 의사들이 ‘힘든 환자’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은 숙명과 같다”고 덧붙였다. 임세원 교수도 생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스스로 되뇌면서 그분들과 힘겨운 치유의 여정을 함께한다”며 환자들이 사회적인 낙인 없이 치료받는 사회를 꿈꿨다.
황예랑 박현정 기자
yrcomm@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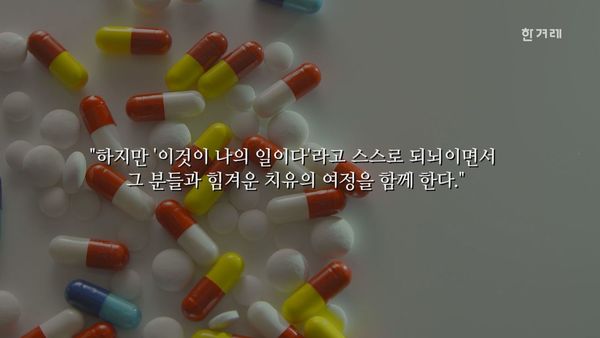



기사공유하기